|
흐르는 세월을 잡을 수 없나보다.
조각 햇살에 잎 돋나 싶더니 어느새 하늘까지 하얗게 덮다니.
잎새를 띄운 나뭇잎은 윤기를 더하고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싹을 띄워 푸르름의 여름으로 넘어가고자 몸부림친다.
하지때쯤이면 마을에는 한두 그루쯤 있는 이팝나무에서 흰꽃이 핀다. 꽃이 마치 흰 쌀밥 같이 온 나뭇가지를 뒤덮으며 피는데 꽃이 한꺼번에 잘 피면 그해 풍년이 들고, 꽃이 신통치 않으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쌀밥나무라 부른 이팝나무를 통해 그해의 풍흉을 점쳤던 것이다.
하얀꽃더미가 마치 사발에 소복이 담긴 쌀밥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니밥>이밥>이팝이 된것이다. '니팝나무/니암나무/뻣나무'라고도 부른다.
가난은 목숨을 쥐었다 놓았다 하였다. 봄에 피어나는 많은 식물과 꽃들이 먹거리며 보릿고개와 이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부모 세대의 가난을 때로는 애써 잊고 싶어할 때도 있다. 모두가 먹거리와 관련되는 이름이다.
이팝나무, 꽃 같은 시 /오인태
뉘이신가 이맘때쯤,
어디서 영문도 모르게 죽어
제삿밥 한 그릇도 못 얻어 드실,
이 땅 귀신 제위께
모락모락 하얀 이밥을 지어 바치시는 저 극진한
시, 딱 한 편만 써서 소지처럼 올리고 죽었으면
이팝나무꽃보다 한달 정도 먼저 피어나는 꽃이 조팝나무꽃이다. 조팝나무는 줄기에 다닥다닥 달린 작은 흰 꽃들이 마치 튀긴 좁쌀을 붙인 것처럼 보여서 '조밥나무'라고 하던 것이 발음이 강해져 '조팝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조팝나무꽃 - 김승기
싸리나무 같은 것에
다닥다닥 붙어
웬 옥수수 팝콘인가 찹쌀 강정인가
잊곤 했던
어린 시절 배고픔일까
아찔한 그리움
너를 보면
비어버린 가슴 다시 채울 수 있을까
지나간 세월 모두 내려 놓은 지금
남아 있는 그리움은
욕심의 그늘
무엇을 애달파하며 또 채우려고 하나
너의 그 하얀 웃음으로
모든 걸 지우고자 한다.



▲ 이팝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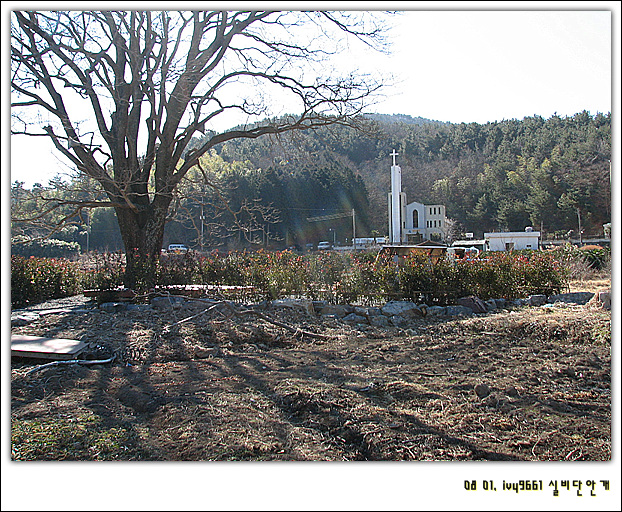
지난 2월, 시인과 찾았던 거제 덕포동네의 이팝나무다. 이팝나무는 나무로는 드물게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덕포(德浦) 이팝나무
◈ 지정번호 : 경상남도 기념물 제95호
◈ 수량 및 규모 : 1주
◈ 소유자 : 거제시
◈ 소재지 : 옥포2동 1039번지
이 나무는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주로 자라며 옛날에는 당산목으로 많이 심었다. 나무의 높이는 15m, 둘레 3m, 수관은 동서 16m, 남북 14m로 수령은 약 300년 정도이다.
꽃잎의 모양이 흰 쌀밥과 같다하여 흔히들 이팝나무라고 한다. 5월 초순부터 하순에 걸쳐 꽃이 활짝 피게 되면 나무가 온통 백설로 뒤덮인 것처럼 장관을 나타낸다. 덕포동의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나무의 꽃피는 모양을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점쳤다고 하는데 즉 꽃이 활짝피면 풍년이 들고 꽃이 시름시름하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이 나무 곁에 있는 작은 돌무더기로 된 탑은 이곳 사람들이 마을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면서 쌓았다고 하며, 왜적이 침입할 때면 방어용 무기로도 사용하였다고 한다. (출처 : 거제문화 예술교육)

▲ 조팝나무꽃
어릴 때 이 계절은 너무 더웠다. 개울가의 치렁한 찔레꽃도 더웠다. 그러나 맛도 모르는 그 줄기를 꺾어 껍질을 먹곤 하였다. 아주 못 먹고 자란 세대는 아니었지만, 주변의 많은 식물들을 당연히 먹거리로 생각하며 자랐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대할 때는 지극히 주관적인데, 꽃의 향기도 그러하다. 어떤이는 슬픈 향기, 어떤이는 은은한 향, 어떤이는 달콤한 향으로 기억되는 꽃의 향기다. 향기보다는 냄새라는 말이 더 살갑다. 몸에 감기는 듯 하여.
몇 년전 친구가 장사익의 찔레꽃을 들어 보았냐고 물었다. 장사익? 찔레꽃?
CD를 구입하였다. 종일 장사익만 들었다. 몇 날, 몇 달을. 식구 모두가 중독이 되었다.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
.
.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사익의 소리는 정호승의 시, 허허바다이다.
소리가 된 詩 허허바다.
찾아가 보니 찾아온 곳 없네 / 돌아와 보니 돌아온 곳 없네 / 다시 떠나가 보니 떠나온 곳 없네 / 살아도 산 것이 없고 /
죽어도 죽은 것이 없네 / 해미가 깔린 새벽녘 / 태풍이 지나간 허허바다에 / 겨자씨 한 알 떠 있네
내가 좋아하던 찔레꽃은 … 엄마 일 가는 길엔 하얀 찔레꽃 /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오 /
.
.
.
마루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우리 엄마는 매일 바빴다. 객지로 돌며.
배가 고팠던 게 아니고 엄마가 고팠던 것이다.
엄마와 함께 나들이를 시작한지는 얼마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가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서로 제 자리에서 하루를 사는 게 의무였었다. 누가 지키며 강요하지 않았어도.
어느날부터 주어진 새롭고 이상하던 자유가 이제 진짜 자유가 되었다.
그러나 엄마 머리 염색 해 드리는 일은 여전히 생색내기다.
오래전 엄마가 그러셨다.
"니는 내가 안 보고 싶더나, 나는 니가 보고 싶어 죽을 뻔 했다 … "
… ….





▶ 우토로 살리기 마지막 모금 운동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donation/view?id=3535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