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찾아가는 시인, 찾아오는 독자 프로그램
▷ 주최 : 진해시김달진문학관
▷ 주관 : (사)시사랑문화인협의회 경남지회
▷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인과 독자와의 만남 · 5
시야, 놀자!
초대시인 : 최동호 / 우무석
기획 · 사회 : 이서린(시인)
일시 : 2008년 02월 02일(토), 오후3시
장소 : 진해시김달진문학관 세미나실
진해시김달진문학관
최 동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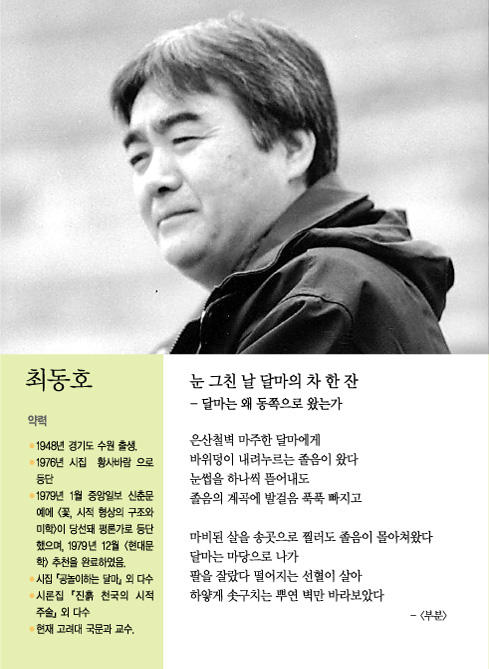
풀이 마르는 소리
벽지 뒤에서 밤 두시의
풀이 마르는 소리가 들린다.
건조한 가을 공기에
벽과 종이 사이의
좁은 공간을 밀착시키던
풀기 없는 풀이 마르는
소리가 들린다.
허허로워
밀착되지 않는 벽과 벽지의
공간이 부푸는 밤 두시에
보이지 않는 생활처럼
어둠이 벽지 뒤에서 소리를 내면
드높다, 이 가을 벌레소리.
후미진 여름이
빗물진 벽지를 말리고
마당에서
풀잎 하나하나를 밟으면
싸늘한 물방울들이
겨울을 향하여 땅으로 떨어진다.
오막살이
― 달마는 왜 동쪽으로 왔는가
빈 숲의 딱따구리 소리여
움직일 곳 바이 없구나
오막살이 집
구부린
벌레 한 마리
눈 그친 날 달마의 차 한 잔
― 달마는 왜 동쪽으로 왔는가
은산철벽 마주한 달마에게
바위덩이 내려누르는 졸음이 왔다
눈썹을 하나씩 뜯어내도
졸음의 계곡에 발걸음 푹푹 빠지고
마비된 살을 송곳으로 찔러도 졸음이 몰아쳐왔다
달마는 마당으로 나가
팔을 잘랐다 떨어지는 선혈이 살아*
하얗게 솟구치는 뿌연 벽만 바라보았다
졸음에서 깬 달마가 마당가를 거닐었더니
한 귀퉁이에 팔 잘린 차나무가
촉기 서린 이파리 햇빛에 내보이며
병신 달마에게 어떠냐고 눈웃음 보내주었다
눈썹도 팔도 없는 달마도 히죽 웃었다
눈 그친 다음날
바위덩이 졸음을 쪼개고 솟아난 샘물처럼
연푸른 달마의 눈동자
(여보게! 차나 한 잔 마시게나)
* 혜가는 어깨 높이로 눈 내린 날 스승에게 법을 물었다. 스승 달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팔을 자르고 난 다음 혜가는 달마의 법을 얻었다.
생선 굽는 가을
― 달마는 왜 동쪽으로 왔는가
썰렁한 그림자 등에 지고
어스럼 가을 저녁 생선 굽는 냄새 뽀얗게 새어나오는
낡은 집들 사이의 골목길을 지나면서
삐걱거리는 문 안의
정겨운 말소리들 고향집 불빛 그리워 되돌아보면
낡아가는 문틀에
뼈 바른 생선의 눈알같이 빠꼼이 박힌
녹슨 못 자국
흐린 못물 자국 같은 생의 멍울이 간간하다
공놀이하는 달마
― 달마는 왜 동쪽으로 왔는가
저물녘까지 공을 가지고 놀이하던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공터가 자기만의
공터가 되었을 때
버려져 있던 공을 물고
개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걸어 나와 놀고 있다
처음에는 두리번거리는 듯하더니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혼자
공터의 주인처럼 공놀이하고 있다
전생에 공을 가지고 놀아본 아이처럼
어둠이 짙어져가는 공터에서 개가
땀에 젖은 먼지를 일으키며 놀고 있다 다시
옛날의 아이가 된 것처럼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공터에서 쭈그러든 가죽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개는
놀이를 멈출 수 없다 공터를 지키고 선
키 큰 나무들만 골똘하게 놀이하는 그를
보고 있다 뜻대로 공이 굴러가지 않아 허공의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보는 눈길이 늑대처럼 빛날 때
공놀이하던 개는 푸른빛 유령이 된다 길게 내뻗은 이빨에
달빛 한 귀퉁이 찢겨 나가고
귀신 붙은 꼬리가 일으킨 회오리바람을 타고
공은 하늘로 솟구쳤다 떨어지기도 한다
어둠이 빠져나간 새벽녘
이슬에 젖은 소가죽 공은 함께 놀아 줄
달마를 기다리며 버려진 아이처럼 잠든다
저물녘 미륵부처 돌뺨
저물녘 쓸쓸한 바람 어둑히 불어
미륵부처 냉한 돌뺨도
붉으레한 그리움이 물들어 온다
슬픔도 기쁨도 멍울처럼
푸르게 반점 박힌
묵묵한 돌뺨 어루만지며
쓸쓸한 바람 멀리 불어
어스레한 저물녘
들판 질러가는 미륵부처 돌그림자
외롭게 깊어지던 검은 눈에도
핑하고 눈물이 휘돌아
마음 저린 들꽃 하얗게 피어나는가 보다.
최 동 호
▷ 등단 연도
1948년 경기도 수원 출생. 고려대학교 동대학원수료 . 경남대, 경희대 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 국문과 교수.
1976년 시집 ≪황사바람≫으로 등단
1979년 1월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꽃, 시적 형상의 구조와 미학>이 당선돼 평론가로 등단했으며, 1979년 12월 <현대문학> 추천을 완료하였음.
▷ 저서
1. 시집
≪황사(黃砂)바람≫, 열화당, 1979.
≪아침책상≫, 민음사, 1988.
≪지상(地上)에는 진눈깨비 노래가≫ 공저, 민음사, 1992.
≪딱따구리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민음사, 1995.
≪공놀이하는 달마≫, 민음사, 2002.
2. 시론집
≪현대시의 정신사≫, 열음사, 1985.
≪하나의 도(道)에 이르는 시학≫, 고려대출판부, 1996.<< 시읽기의 즐거움≫, 고려대출판부, 1999.
≪디지털 문화와 생태시학≫, 문학동네, 2000.
≪한국현대시사의 감각≫, 고려대출판부, 2004.
≪진흙 천국의 시적 주술≫,문학동네, 2006.
□ 연락처
(02)928-7016(시사랑문화인협의회)
우 무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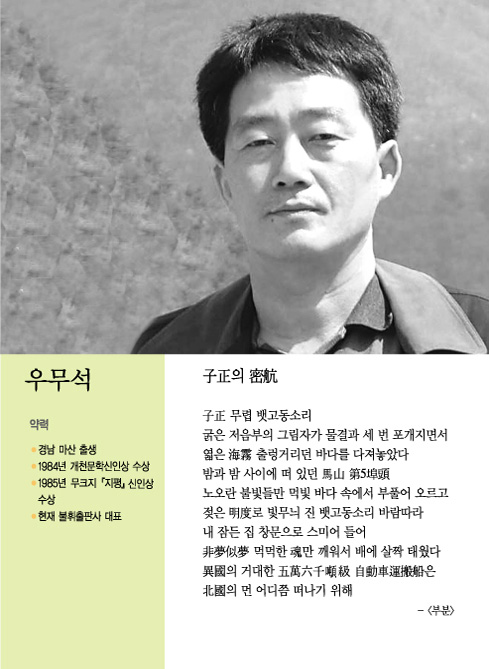
子正의 密航
子正 무렵 뱃고동소리
굵은 저음부의 그림자가 물결과 세 번 포개지면서
엷은 海霧 출렁거리던 바다를 다져놓았다
밤과 밤 사이에 떠 있던 馬山 第5埠頭
노오란 불빛들만 먹빛 바다 속에서 부풀어 오르고
젖은 明度로 빛무늬 진 뱃고동소리 바람따라
내 잠든 집 창문으로 스미어 들어
非夢似夢 먹먹한 魂만 깨워서 배에 살짝 태웠다
異國의 거대한 五萬六千?級 自動車運搬船은
北國의 먼 어디쯤 떠나기 위해
이미 화물칸의 무게와 바닷물높이를 가늠하여 물질하는데
세상 떠도는 것에 대한 설렘과
떠나고 남는 것에 대한 아련한 미련들에 떨려오는
내 魂자락에 숨은 어둠
쏘삭하게 돋아난 그리움 몇 알로 두근거릴 때
푸른 달그림자가 앞서서 배를 出航시켰다
바닷길의 벼랑과 물의 구렁텅이 사이로 航海는 시작되었지만
시간에 휘감긴 뭍의 사람에게는 한낮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밤의 경계마저 아슬아슬하다, 잠의 海峽을 넘어서기도 전에
내 魂은 위험한 물파랑에 쓸려
深淵 아래로 아래로 아득하게 가라 앉았다
허우적이다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했다
뱃고동소리 속으로 배만 떠나가버렸다
붉은 방
- 잔느 에뷔테른 Jeanne Hebuterne에게
창문은 아주 많이 달려 있었지만
불빛은 적었던 빌딩 꼭대기 당신의 방
언제나 복도는 깊고 조용했다
불이 켜지면
당신의 방은 푸른 물소리에 금세 잠긴다
침대에 반듯이 누운
당신의 매끈한 몸 위로 숨소리의 그늘 하얗게 엉겨서
밤이 무늬진 유리창에는 성에꽃으로 덮였다
엷은 입술 사이로 장미향기 벙글어
당신의 방은 젖빛 구름그림자 금세 자욱하다
당신 모가지처럼 가늘고 길었던 꿈
슬프거나 아름다웠던 나날들의 숨결들의 세월이
축축한 달무리에 둥글게 감겨서 음악처럼 떠다녔다
한 쪽 어깨 드러낸 알몸으로 쓸쓸히 앉았을 때
벽거울에 비친 약속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던 세상
물끄러미 바라보는 당신의 눈 속에서
붉은 방 하나가 생겨나고 있었다
오직 낯선 천국에서나 열릴 수 있는.
水平線이 있는 집
- 매미의 추억 1
馬山바닷가 집들은 모두 水平線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집이 앉은 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바다가 가까울수록 水平線의 위치가 높아진다. 처마밑에 水平線을 두른 집도 많지만 내 집은 방 안에서 가슴높이 쯤에 水平線이 그어져 있다. 이 水平線은 颱風 ‘매미’가 깜깜한 비바람의 바다를 빳빳하게 세운 채 집집마다 골고루 찾아다니며 새겨놓은 물금이다. 한밤중에 닥친 海溢이 허물어지던 순간 나는 보았었다, 집들이 물결에 감겨 둥둥 떠 보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것을. 장판이 들뜨고, 바닥이 터져 일어나고, 뜰 만한 것은 모조리 헤엄치면서 검은 물무늬 위로 일렁거렸다. 바다가 제자리로 돌아가 버릴 때까지 방안에 떠다니는 波濤의 힘에 이리저리 쓸리며 집이 몇 번씩 둥싯 떠올랐다가 주저앉았다. 그날 이후, 소금처럼 잘 마른 水平線이 생겨났고 이 물금높이가 바로 집들이 가진 浮力이 되어 버렸다. 꿈 속같은 풍경을 직접 본 사람들은 집들과 오랫동안 不和했다.
여름 연가
햇볕 쨍쨍한 여름날이면
내 도마이(道萬里) 바다에 가서
정결한 남쪽 바다 물빛 한 모퉁이
이쁘게 떼낸 다음
하얀 구름덩이 하나 덤으로 띄워
당신 방 안에서 출렁이게 하겠네
그러면 당신
치마 살풋이 걷어올려
매끈한 종아리 내놓고서
한나절 찰박찰박 물장난 치고
나는
그 맑은 물소리의 푸른 그늘에 누워
낮잠이 들면
꿈에서도 바다를 걷어오려고
또다시 바다로 가네.
생일
어두워진 만큼의 저녁을 데리고 빈 방에 돌아와 스위치를 켰습니다.
수족관 고기들 물질소리가 파란빛으로 파드득파드득 거리다가 형광등이 하얗게 빛납니다.
물 깊은 방안 고요가 환해지고, 대뜸
내 사는 일도 세상에서 저렇게 잠깐 점멸하다 마는게 아닌가 싶어
조금 슬퍼집니다.
내가 나를 48년째 기다려 온 날입니다
지하실 수족관
-매미의 추억 2
가고파 오피스텔 지하에 있던 <유림식당> 주인 내외는 열흘 넘게 도망 못간 바닷물을 작은 양수기 두 대로 퍼내면서도 단골인 나를 보면 희미하게 웃어 주었습니다 닷새를 더 보태어 물을 길어 올리니 한 뼘 아래 물바닥이 요란스럽게 뒤채면서 꿈지럭꿈지럭거립니다 숭어, 볼락, 쏨뱅이, 노래미, 농어, 게르치, 참돔, 장어 십수 마리 펄쩍거리며 몸을 털고 참게도 몇 놈이 비척비척 기어나옵니다 구경꾼이던 동네 사내들이 깜깜한 지하실로 우르르 내려가 고기를 더틋느라 야단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느 틈에 식당의 도마와 식칼을 찾아 내놓고 소주병에 낀 뻘자국을 닦으며 술판 차리는 사람도 있고, 어디서 알았는지 여인네 서넛은 빨간 다라이를 끼고 뒤뚱대며 내려갑니다 그 북새통에 치여 식당에는 아예 내려가보지 못한 주인 내외가 서로 붙잡고서 끝내 울고야 맙니다 망한 것도 망한 것이라지만 사람 인심 그런 거냐며 서럽게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늘에 뜬 반쪽짜리 달빛마저도 쌍그랗기만 했습니다.
□ □
찾아가는 시인, 찾아오는 독자의 만남
제 1회 초청시인 : 권혁웅, 김 륭
제 2회 초청시인 : 서정춘, 조은길
제 3회 초청시인 : 강은교
제 4회 초청시인 : 유홍준, 박서영
제 5회 초청시인 : 최동호, 우무석
댓글